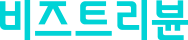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진짜 환자'와 '나이롱 환자' 구별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지적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지금 금융당국의 모든 관심이 보험사에 집중돼 있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괜히 불똥이 튈까봐."
복수의 보험사 관계자들은 즉시연금 사태 등 금융당국의 '타깃'이 된 현재를 두고 최근들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앞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집중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소극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가 마무리되는 즉시 '암보험 사태'가 또 다른 분쟁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즉시연금과 암보험 모두 보험사와 민원인 간 입장차가 워낙 팽팽해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이 커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암보험금 분쟁 관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국민검사청구는 지난달 24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을 대표로 암보험 가입자 200여명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를 낸 데 따른다. 이날 금감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암보험 분쟁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의 요양병원 치료·입원비 보장 여부다. 보험사들의 '직접적 치료에 한해 보장한다'는 암보험 약관을 둘러싸고 요양병원 치료·입원비를 '직접 치료'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현재 대형병원에 자리가 없거나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았지만 약이 독해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암환자들과 요양병원 치료는 암의 직접적 치료가 아닌 만큼 보장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암환자 측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초 금융감독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보험사에서 요양병원 치료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요양병원에 거짓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과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무턱대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보험사 임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으로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들, 흔히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설립되기 쉬운 환경인데 실제 보험사기를 위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중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고객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뻔해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기를 위해 불법 운영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6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89건, 2017년 263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눈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요양병원 치료·입원비에 대한 암보험금 지급 논쟁 전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나이롱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번 암보험 분쟁도 마찬가지고 보험사기를 막지 못하면 결국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무턱대고 소비자를 두둔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