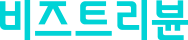최근 공개된 KT 차기 대표이사 재공모 지원자 명단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여간 따갑지 않다.
KT 출신 전·현직 인사뿐 아니라 업계와는 상관없는 정치권 인물들이 다수 포진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미 20여 년 전 공식 민영화를 이룬 KT는 공기업 뿌리를 갖고 있을 뿐, 재계 순위 12위의 명실상부한 거대 민간통신회사다. 그러나 25조6000억 원 매출에 50여 개 계열사를 갖춘 이 거대기업 수장을 뽑는 데엔 어쩔 수 없는 공기업 뿌리의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KT는 정부와 대통령이 지적했듯 엄연한 소유분산기업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는 달리 소유 지분이 자잘히 분산돼 특정 오너나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란 뜻이다. KT뿐 아니라 포스코와 금융지주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KT 지분 10%가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다 보니 아직도 정부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KT 대표 재공모도 이사회가 정부 측 눈치를 봤다는 뒷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업계와 정치권 언저리에선 ‘윤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단 소리까지 들린다.
KT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CEO로, 영업이익을 40% 늘리며 현재에 이른 구현모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적격’ 판정은 선임 절차 투명성을 이유로 무시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유분산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작동론’이 발화점이 됐을 터다. 구체적으로 연임이 유력했던 구 대표는 여권 비토 대상으로 당초 정부 눈 밖에 났다고 보는 게 맞다.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건전화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유로 KT 대표 선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신 대표 선임 절차 완전 공개 및 경쟁 원칙으로 일말의 논란을 잠재울 명분은 만들어졌다.
정작 KT 신임 대표 재공모가 시작되자 기다렸단 듯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달려들었다.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진 IHQ 총괄사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권은희 전 의원의 경우 KT 임원 출신이라곤 하나 이미 업계를 10년 이상 떠난 ‘올드보이’란 평판이 뒤따른다. 지난날 스스로 정치권 인사가 KT 대표로 영입되면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전자정부론 권위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장도 역임했다. 일각에선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단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윤진식 전 장관과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고령의 윤 전 장관 또한 IT 통신 경영 경험은 없다.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전 본부장과 방송인 출신 박종진 총괄사장은 통신업계 전문성 측면이 약점으로 부각된다.
혹자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시되는 전문성 부재 논란이 구시대적 발상이라 비판할 지 모른다.
‘챗GPT’가 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마당에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과 총체적 비전의식이야말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자랑하는 KT 수장의 최고 덕목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통신산업 특성상 현 정부·여권과 소통이 원활한 인사가 KT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단 견해도 일순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KT 대표 후보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풍부한 경영·경제 지식과 경력 △기업경영을 통한 성공 경험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정보통신 분야 전문적 지식과 경험만큼이나 모호한 생각이다.
KT는 당장 AI와 디지털 전환(DX)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비록 3년의 임기라도, 차기 대표부턴 통신사업 뿐 아니라 신사업인 ‘디지코(디지털플랫폼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낼 수 없는 성과이기에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 기반이 마련되고 누적돼야 한다. 일개 정권 유한성과는 비할 데가 못된다. 사업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 가중치가 부여돼야 한다.
KT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기 유영상 대표와 황현식 대표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 모두 한 회사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으며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경영인이다. 때론 적에게서도 배울 점이 생기는 법이다. 하긴 현재 KT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희망사항일지 모른다.
무엇보다 국민이 우려하는 바는 아직도 공기업 뿌리의 태생적 한계를 KT 스스로 극복하지 못할까 하는 점이다.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어도 KT는 여전히 국영기업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인상이 강하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한 마디’와 때를 맞춘 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일사불란한 출사표가 그 선입견을 배가시키고 있다.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말로 정치를 규정했다.
그 적실성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정치 개념을 통해 정권 교체기나 초창기에 오르내리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시점은 아닌지, 이 땅의 위정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권위’만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운명을 거머쥔 신성장동력 주체가 그들만의 일개 ‘가치’가 아니란 인식이 작동할 때 더욱 그렇다.
[비즈트리뷴, 김기범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