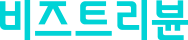몇 년 전부터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렌털사업도 각광을 받았다. 자전거, 킥보드부터 시작해 자동차 공유, 사무실 공유 등으로 이어진 '빌려 쓰는' 문화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진 모습이다.
소유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돈을 아껴주고, 자원 낭비를 막아준다는 것이 렌털 경제가 내세운 메시지였다. 개인별로 새 것을 사고 버리는 것을 지양하면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소비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 실제로 그 '마케팅'은 새 트렌드가 됐고, 본격적인 소비층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말 공유가 친환경일까
이제는 패션 공유, 옷장 공유 등 의식주의 모든 곳에서 자리잡은 대여(렌털) 사업은 얼핏 보면 자원 순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돈을 절약하자는 경제적 측면이 아닌 친환경적인 면에서 본다면,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한 환경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의류 소비 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다소 다르다. 환경 전문가들이 옷을 소비하는 5가지 방법(옷을 사서 오래 입기, 짧게 입고 버리기, 렌털하기, 중고 사기, 재활용하기) 중 어떤 것이 환경에 가장 악영향을 줬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그 결과 렌털해 입는 것이 가장 환경에 악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빌린 옷을 집으로 배달 받거나 반납할 때 필히 종이·비닐·플라스틱 백 같은 포장재가 사용되는 것을 생각해보자. 또 빌려 입은 옷을 세탁하고 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탄소와 유해물질이 나온다. 즉 렌털 창고에서의 운송 과정, 재처리 경로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옷을 사서 입다가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친환경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렌털 사업이 패스트패션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인식에 경종을 울린다. 결국 최선은 옷 한 벌을 사서 오랫동안 입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필요하면 '리페어(수선)'도 하면서 말이다. 아울러 한 제품을 오래 잘 쓰기 위해서는 (단순 저렴한 제품보다) 처음부터 좀 값이 나가더라도 품질과 내구성이 탁월한 소재를 고르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마케팅 업계에는 상품의 '계획적 노후화'라는 말이 있다. 제품을 팔 때 한번 산 물건을 오래도록 사용하게 하면 안 되고, 수명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회사가 출시하는 새 제품을 많이 구매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기업의 논리다. 동시에 신제품을 향한 소비자의 욕구도 자극한다.
이렇다 보니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수선과 수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아직까지도 수선은 가능하지만 몇 달씩 걸리거나 고치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 차라리 새 것을 사자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너도나도 표방하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려면 고쳐 다시 쓰는 것이 결론적인 해답일 수 있다. 의류기업 파타고니아의 수선캠페인 'Worn wear'의 슬로건은 '새것보다 좋다(better than new)'다. 자사 브랜드가 아닌 타사 브랜드의 제품도 수선해주고, 다른 매장뿐 아니라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고쳐주기도 한다.
매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새로 생겨나고, 쌓이고, 버려지는 지구에서 기업이 가야 할 친환경의 길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럴듯한 이미지에 치중된 마케팅보다는 진정한 환경성에 대한 기업의 고민이 계속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