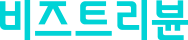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울산광역시가 요즘 시끄럽다.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 현대중공업이 본사를 서울로 이동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시장은 물론 울산 지역구 의원들, 노조 등 정치이념을 떠나 한마음으로 현대중공업 지키기에 발벗고 나섰다.
울산은 현대중공업을 세계 1위 조선기업으로 키워낸 산실이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둥지를 튼 이후, 울산경제는 현대중공업의 사세확장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선업황이 초호황을 누렸을 당시, 울산경제는 활력이 넘쳤다. 물론 조선업황이 가라앉고 현대중공업이 고전하면서 울산경제도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제 7~8년간의 불황을 거쳐 조선업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는 터에, 현대중공업이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고 하니 울산시장, 울산 정치인, 현지 노조들은 '절대 보내줄수 없다'고 결사항전을 선언한 형국이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60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2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시민총궐기대회까지 준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여부는 울산경제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현대중공업이 매년 내는 법인세가 적지않은데다 본사이전에 따른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울산시민들의 '현대중공업 매달리기'는 그야말로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의 대기업 유치나 유지는 지역경제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는 인식과 판단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뜨거운 '러브콜'과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바로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이른바 글로벌시장에서 통하는 한국의 자랑스런 기업이다.

삼성은 그러나 현대중공업과는 처지가 다르다. 그야말로 찬밥신세를 면하지못하고 있다.
삼성 오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명에 '괘씸죄'를 면하려고 일련의 경영적 판단을 했다는 중론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법부에서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재벌사를 알만한 사람은 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하명을 거부할때, 어떤 시련을 겼었는가?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에는 눈을 감은 사법부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넘어서도 삼성 압박을 멈추지않고 있다.
삼성오너와 삼성 가족들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적지않은 장면이다. 그렇기에 '내가 삼성오너라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회자된다.
삼성그룹이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한다면? 아직은 삼성 관련기사의 댓글에나 등장하는 가정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진공청소기와 헤어 드라이기로 유명한 다이슨의 경우,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키로 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물론 삼성본사의 해외이전은 법적으로 쉽지않다. 무엇보다 국내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이니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 때문에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비현실적인 일은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울산시장과 울산 지역구의원들의 간절한 '외침'을 귓등으로 스쳐보낼 일이 아닌듯싶다.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집권당이라면 삼성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떠날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듯 싶다.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의 눈치보기와 요구에 부응하는 의사결정과 판단은 지난 2년으로 충분했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미국과 중국이 '멱살잡이'를 하는 글로벌위기 국면이다. 이 고래들 싸움에 끼인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양쪽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는 길일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