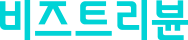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비즈트리뷴=김려흔기자]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Sometimes when you innovate, you make mistakes. It is best to admit them quickly, and get on with improving your other innovations.)"
이 시대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미국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애 남긴 명언이다.
잡스가 자신을 경험을 빗대어 말한 그 명언이 통한 것은 바로 중국이다. '짝퉁'의 이미지가 강한 중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선도하는 장악력은 더이상 모방의 형태가 아니다. 이제 어느 분야든 중국을 빼놓고는 사업 전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IT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을 더이상 견제가 아닌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상황과 잡스의 명언을 돌아보며 정부와 우리 기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G마켓의 성격을 띠는 중국의 알리바바, 중국의 카카오라 불리는 텐센트 등과 같이 IT 기반의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기업자체의 경쟁력 못지않게 중국의 국가 전략도 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IT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성격을 띠는 나라라는 인식 때문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새 인프라 형성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시장 자유주의 경제체제인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국민의식과 정부는 다양한 면으로 열려있다. 또한 인구수와 자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자국 기업이 무조건 유리한 환경이다.
중국 정부에서 막거나 제제하는 것은 오로지 타국의 것들이다.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북미진출보다 어렵다는 것은 게임·유통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국내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제재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밀고당기기' 를 하는 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알리페이 등 해외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진출, 손쉽게 자리잡았다.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해외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나 여의치않다. 기술과 통신이라는 것을 제재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 계산해 제도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는 많으면서 성장은 하라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통은 하는데, 정작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학계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과거 보안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는 당장의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책임'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면 시행착오는 언제나 따라오기 마련인데 우리 국민과 정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용납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기업들은 몸살을 앓았다.
이슈 뒤에 따라오는 책임 문제 역시 결국 기업의 몫이었다.
일부 기업인은 수년간 연구해서 시장에 내놓은 기업들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입법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신속한 일처리 속도에 놀라기도 했다고 전한다.
지금도 적지않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논의만 무성하다. 바로 그 사이 중국 정부는 바이오·신에너지 분야 등 다가오는 미래에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IT세계의 주권, 기업들의 순위경쟁 아냐
중국의 발전 중 우리나라의 비교사례에 빠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는 삼성페이와 알리페이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이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빠르게 확산된 반면, 삼성이 내놓은 삼성페이는 여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아 질타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닌 문화와 정서적 차이를 극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중국의 경우 현재 길에 상주하는 거지들의 동냥방식도 큐알(QR)코드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신체에 큐알코드를 걸고 사람들은 기기를 갖다대는 방식이다. 이같이 중국에서 전자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 중국사회와 무관치않다. 과거 중국은 위조화폐가 많은데다 정규직이 많지않아 신용카드 보급이 우리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전자결제서비스의 활성화여부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정부가 놓치고 있는 또하나는 한계에 부딪힌 국내 유통기업들의 문제다.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떠오른 중국 알리바바에 입점했던 한 국내 대형 유통기업은 터무니 없는 그들의 요구에 자진 철수했다고 한다.
이렇게 진입장벽에 막힌 기업들은 내수시장에도 기댈 수 없어 발만 동동구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다.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알리바바나 아마존으로 쇼핑을 하는 반면 중국 현지인들의 상당수는 우리 기업들의 좋은 이미지와 높은 퀄리티 때문에 국내 사이트를 이용해 쇼핑을 애용한다게 중국 지인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이를 기업이 겪는 성장통의 일부로 판단해서 타국의 성공 사례를 쫓아가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 아닌듯 싶다. 국내 기업들의 강점을 내세워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주권은 보이지 않는 '영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일 수 있다.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발전된 국가를, 성공한 기업을 따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이는 수치가 아닌 보이지않는 환경과 문화를 심는 DNA를 고민해야한다.
특히 글로벌무대에서 디지털 주도권은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ICT가 영향을 끼칠 영역 중 국가안보 수준 역시 기존과 다르다. ICT세계에서 디지털 주권을 갖는 것은 기업들의 순위경쟁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찾는데 전력투구 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