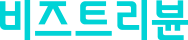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취재노트] 삶 개척하고 실력 인정받는 재벌3세들
스웨덴의 대표 재벌 가문인 발렌베리 가문(Wallenberg Family)의 후계자 선정 원칙 중 하나다. 베일에 싸인 재벌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다. 이처럼 재벌은 한사회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나, 그들의 삶 자체는 지금껏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창업주 세대가 아닌 이제 경영 일선에 나서기 시작한 재벌 2, 3세 자손들의 삶은 더욱 그렇다.
과거 ‘맨손으로 자수성가한’ 성공신화로 대변됐던 창업주 세대의 재벌과는 달리 최근의 ‘재벌 3세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마치 봉건시대의 ‘귀족’ 계층과도 같다.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것과 같은 최고급의 교육과 대우를 받으며 성장하다보니 ‘특권 의식’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을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각인시킨 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다. 재벌가 자녀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를 단순한 ‘반기업 정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 ‘땅콩 회항’사건을 겪은 이후 대한항공의 지난해 12월 국내선 여객 탑승객 수는 지난 2013년 12월보다 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탑승객 수는 35만8000명에서 40만6000명으로 13.2%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의 또다른 후계자 선정 원칙은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할 것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실무 경험을 쌓을 것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것 등이 있다. 가문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능력을 사회에서 검증받을 것을 주문하는 조항들이다. 이처럼 재벌가 후계자들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능력’을 갖췄음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업경영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삶 개척하고 실력 인정받는 재벌3세들
우리나라 재벌가도 이같은 사례는 있다. 국내의 일부 재벌 3세들은 자신들이 그저 ‘금수저’를 타고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최태원 SK회장의 차녀 민정씨는 해군 장교로 자원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해군 부서 중에서도 어려운 함정승선 장교에 지원해 ‘충무공이순신함’을 탔다.
부모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도록 훈육하는 재벌가로는 롯데가문을 빼놓을 수 없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아들 신동주,동빈 형제의 학업이 끝난 뒤 바로 자신의 기업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는 3세인 신유열 씨에게도 마찬가지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대 경제학부 졸업 후 1981년 일본 노무라증권에 입사해 7년간 근무 후 1988년 일본 롯데상사에 입사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29세인 신유열씨는 롯데와 관계없는 일본의 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본인 역시 젊은 시절 우유배달, 식당일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몸소 배운 철학을 자식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한다는 것이 롯데그룹측의 전언이다.
재벌 3,4세의 경영, ‘세습’이라기보다 ‘시스템’유지
재벌 3,4세의 능력이 경영성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삼성가의 3세대인 이재현 CJ그룹회장은 2002년 경영권 승계한 이후 기업 자산 증가율 459%로 전체 대기업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으며 그룹 전체 시스템을 관장, '위기돌파'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애플, IBM 등 글로벌 CEO들과 교분을 쌓았고 당시 스티브잡스와 만나면서 삼성 부품을 아이폰에 사용토록 하기도 했다. 삼성 스마트폰이 노키아를 제친 시기도 바로 이 때다.
기업의 경영권 세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의류업체 베네통, 자동차회사 피아트, 언론재벌 피닌베스트그룹, 로스차일드 가문, 발렌베리 가문 등 유럽의 유수 기업들은 모두 총수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물론 경영권 승계는 기업이나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왕조식 ‘세습’이라는 세간의 비판과는 달리 그룹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독일 제약업체 머크의 전 최고경영자 셰이블레는 “가족 회사의 강점은 빠른 의사결정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선대의 창업자정신을 발전적으로 승계한 재벌 2세대들의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덕분이었다. 이제는 대중과의 소통과 전문성을 갖춘 3세대들의 경영을 지켜볼 때가 아닐까 싶다. [비즈트리뷴=박예슬기자]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