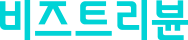정치권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하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타필드,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한 달에 두 번 강제 휴업할 날도 머지않았다. 유통업체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총 11개의 유통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반경 1km 이내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규제돼 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이제는 반경 20km로 20배 늘리겠다며 합법적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준비 중이다.
대자본이 마치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 이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자영업 비율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에선 충분히 고민할 만한 주제이지만, 구멍가게가 대형마트로 대체되는 것은 산업의 '진보'가 아니라 명확한 '퇴보'다. 대형마트가 내 가게 옆에 들어오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대형마트는 다루는 품목부터 질적으로 다르다. 이 의미는 납품업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다양해진다는 것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과 대형마트 중에 누가 소상공인을 더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질문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대형마트'다.
2000년대 초부터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정부가 지원에 힘썼지만, 마케팅, 서비스 개선보다 시설 개선 위주의 지원으로 소비자 유인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으로 보여진다.
결국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소비하고 싶다는. 유통법 규제들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할 것인지도 물음표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긴지 10년이 지났지만 대형마트 강제휴업으로 영세상인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한다고 달라질 거라는 것은 낭만적인 상상이다.
대형마트도 힘들다. 쿠팡 등과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약진 때문이다. 롯데, 홈플러스는 구조조정 중이다. 지금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도 나름의 고민을 해봐야 한다.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리는 치타는 자신의 멋잇감인 톰슨가젤(속력 80킬로미터)을 사냥할 때 10번 중 7번을 실패한다. 우세한 조건을 갖추고도 사냥 성공률이 3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 신기한 일이다. 치타는 그 경주에서 지더라도 다시 뛸 수 있지만, 가젤은 생사가 달린 문제다. 먹기 위해 뛰는 것과 죽지 않기 위해 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비즈트리뷴=박진형 기자]